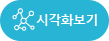| 항목 ID | GC04400521 |
|---|---|
| 한자 | 祝聖庵磨崖佛 |
| 분야 | 종교/불교,문화유산/유형 유산 |
| 유형 | 유물/불상 |
| 지역 |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5 |
| 시대 | 근대/일제 강점기 |
| 집필자 | 이경화 |
| 제작 시기/일시 | 1941년 |
|---|---|
| 이전 시기/일시 | 1994년경 - 축성암 마애불 이전 |
| 현 소장처 | 축성암 마애불 -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축성암 |
| 성격 | 불상 |
| 재질 | 석재 |
| 크기(높이) | 2.2m[높이] |
[정의]
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축성암에 있는 일제 강점기 때의 마애불 좌상.
[개설]
영암 용당리 축성암은 1927년에 목포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처음 지어진 절로 알려져 있다. 그런데 현대 중공업 삼호 조선소가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 1994년경 현재의 자리로 옮겨 왔다. 절을 옮기면서 마애불을 떼어 왔고 탑과 그 조성 내력을 적은 비(碑)인 「미륵불 존상 출세기(彌勒佛尊像出世記)」를 함께 가져 왔다.
[형태]
축성암 마애불(祝聖庵 磨崖佛)은 불상의 상징적 특징인 육계(肉髻)[부처의 정수리 뼈가 솟아 저절로 상투 모양이 된 것]를 표현하지 않고 성기고 짧은 머리, 좁고 긴 얼굴에 수평 진 이마선, 삼각형으로 솟은 코, 두 줄 세로로 내려오는 인중, 그리고 짧게 붙은 귀 등 세속의 인물상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. 아주 약하게 목에 삼도(三道)[불상 목 주위에 표현된 3개의 주름]의 흔적이 있다. 법의는 양 어깨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며 내의는 수평으로 표현되었다. 앉은 자세의 중심을 이루는 명치 아래에 양손을 다소곳하게 포개어 두었다. 가부좌한 하체는 네모진 형체에 두 발만 조각했을 뿐이다. 축성암 마애불은 비숙련공의 자화상과 같아 보일 정도로 불상으로서의 사실성과 신성성을 그다지 갖추고 있지 못하다.
[특징]
조성비의 기록에 의하면 축성암 마애불은 ‘소화 16년 신사(昭和 16年 辛巳)’인 1941년에 조성한 미륵상으로 옥부재(玉夫齋)의 시주로 만들어졌으며, 그 조성 과정을 조병술(曺秉述)이 기록하였다. 당시의 주지는 김해룡(金海龍)이고, 화주는 김의곤(金義坤)이었다.
[의의와 평가]
마애불과 더불어 비와 석탑이 함께 조성되어 근대 불상의 특징을 알 수 있고, 근대 도시 목포 인근의 불교 신앙을 조명하는 자료가 된다.
- 국립 목포 대학교 박물관, 『영암군의 문화 유적』(전라남도·영암군, 1986)
- 목포 대학교 박물관, 『문화 유적 분포 지도』-전남 영암군(전라남도·영암군, 1999)